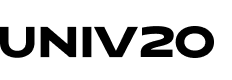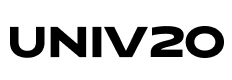대학내일
저기, 신발 좀 실례하겠습니다
나를 둘러싼 세상만 보며 살지 않게 위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여름에 어울리는 스니커즈를 하나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밝은 컬러를 갖고 싶긴 한데 생각해둔 건 그뿐이어서 막상 어떤 것을 사야 할지 망설여졌다.
그러고 나자 길거리에 나서면 온통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저마다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지, 어떤 신발에 어떤 옷차림인지, 그중에서도 운동화 신은 사람만 보면 반가운 마음에 더 눈길이 갔다. 저 디자인은 어디서 났을까, 저런 컬러라면 때가 좀 타도 예쁘겠다, 뭐 그런 생각들. 늘 다니던 거리였고, 타인의 옷차림이라면 무심히 스치는 풍경 중 하나였을 텐데 한동안 은 신발만 알아보는 안경을 쓴 것처럼 거리가 그렇게 보인 것이다.
비슷한 경험은 또 있다. 집에 하나둘 화분을 늘려가면서부터는,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에 눈길이 갔다. 원룸 빌라의 작은 창가에 내걸린 베고니아를 보면 누군가 이사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짐작했고, 베란다를 가득 채운 화분들을 보면 저 창의 안쪽에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싶었다.
벽돌로 세운 화단에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가 가득 자라고 있는 집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았다. 내가 화분을 키우며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분갈이를 하니, 다 른 사람들의 화분을 보면 그런 시간이 자연스레 함께 보였다. 식물을 기르는 마음엔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을 것 같아 괜스레 창 너머 이웃에게 친밀감이 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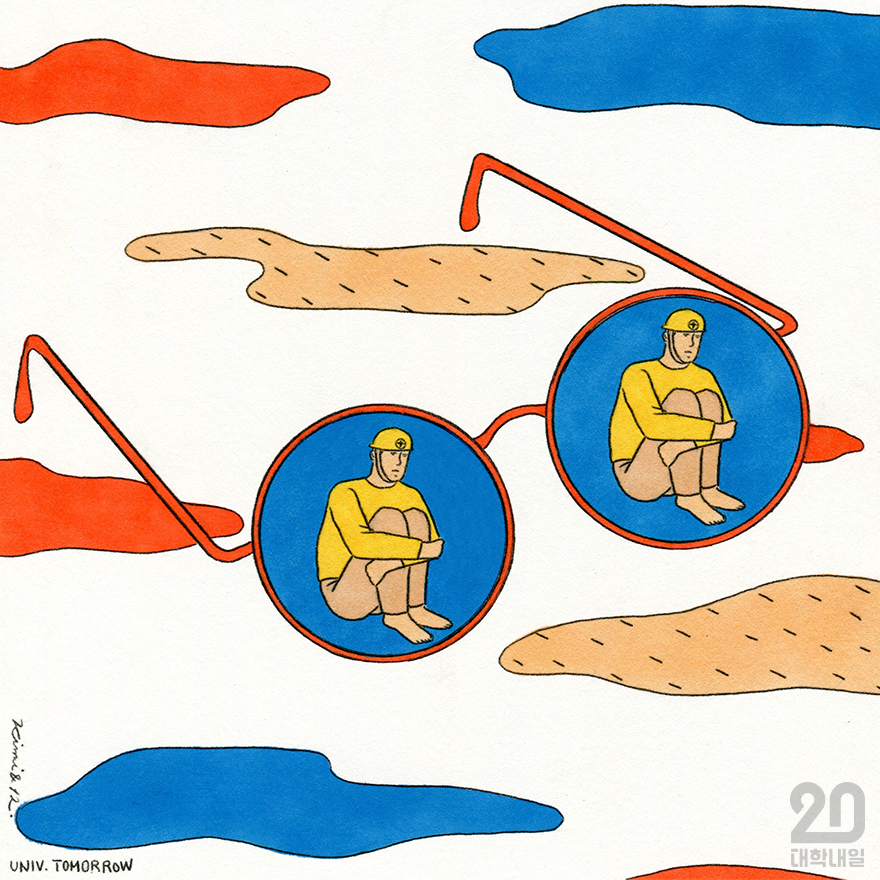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관심사나 처한 환경에 따라 세상을 선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론 새삼스러운 일이다. 풍경이 거기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보려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 선택적인 시야 덕분에, 때론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젠 멀리 여행을 가서도 창가의 화분을 살피게 된 나처럼.
풍경만 그런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야 세상이 ‘새로고침’되어 보이는 일도 잦다. 주말에 갑작스레 앓다가 월요일 아침 병원 문 열자마자 진료를 받으러 간 날이면, 주말 동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구나 놀라게 된다. 그냥 버스를 타고 출근한 아침이었더라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더딘 일이 아닐까. 다행히 우리에겐 다른 이의 사정을 듣는 귀도 있다.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에 나온 한 시민은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이런 얘길 꺼냈다. 자신처럼 만삭에 가까워지면 주차하고 차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옆에 주차된 차에 배가 긁힐 수밖에 없다고. (아아!)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할머니는 버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 저상버스만 들어오면 그렇게 반갑다고도 말씀하셨다. (아아!)
무심히 TV를 보다 귀가 확 뜨였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던 탓이다. 주차하고 내릴 때마다 내 몸의 일부가 긁히는 일, 아픈 다리가 잘 굽혀지지 않아 버스 계단이 원망스러운 일. 내게 일어난 적 없으므로, 여태껏 모르고 살았던 세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얼마든지 더 열거할 수 있다. 내가 겪은 삶이란 지극히 일부분이어서, 그 외의 것들은 바보 같은 소리(아아!)를 내며 매번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란 얼마나 좁은가, 생각하게 된다. 내 경험과 환경 안에서만 이해하는 세계란 결국 딱 그만큼, 1인분의 세계일 뿐이다.
이 땅에만도 5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 나를 둘러싼 세상만 보며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작은 상상력이다. 잠시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놓아보는 일. 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짐작해보는 일.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겪기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살기 좋은 세상’ 은 한 사람의 좋음, 또 한 사람의 좋음을 끊임없이 더해가야 하는 세상이란 것도 알게 된다.
며칠 전, 트위터에서 ‘노 키즈 존’이 논란이 된 것을 보며 지난겨울 제주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늘 다니러 가는 동쪽 해안가엔 그사이 새로운 카페들이 많이도 생겨났는데, 해변과 가까운 카페들엔 노 키즈 존을 써 붙인 곳이 많았다. 카페 안엔 친구나 커플끼리 온 20-30대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거기 앉아 오후 내내 책도 읽고 바다도 내다보다 생각했다. 자주 찾던 이런 곳도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 되는구나. 아이를 가진 몇몇 친 구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 얼굴들이 저 문 앞에서 맥없이 돌아설 것을 생각하니, 이런 기준으로 입장 가부를 나누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기도 했다.
아이와 함께 거리에 나섰더니 유모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건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는 친구의 하소연도 함께 떠올랐다.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나는 내가 아는 하나하나의 얼굴들, 그들이 일상적으로 겪을 냉대와 상심에 대해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함부로 판단 내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인디언 속담은 화장실 문에나 붙어 있는 시시한 금언 같은 것이 되었지만, 그 시시함을 실천하기란 이리도 어렵다. 남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본다는 말. 거기에 오래 걷기까지 한다면, 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 사실 ‘판단’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겠지.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쩌면 그게 다 남의 신발에 발 한번 넣어보는 걸 잊어서가 아닐까 싶을 때가 있다. 일반버 스 계단이 너무 높아 저상버스가 오기까지 그냥 보낸다는 어느 할머니, 남들처럼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고 싶다는 어느 젊은 부모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 그들을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굴며 살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고 잠시 상상해보면 되는 일인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좀처럼 쓰지 않을까.
그러니 혹시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때,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싶어질 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는 맘으로 남의 신발에 발 한쪽 밀어 넣고 생각해보려 한다. 그런다고 뭔가를 이해하게 되려나? 세상이 좀 더 나아지려나? 알 수야 없지만 너무 오랜만에 다시 희망이란 걸 생각하게 된 이 땅에서, 나도 새 다짐 하나쯤은 하고 싶다. 아, 일단은 아직 사지 못한 신발부터 사고.
그러고 나자 길거리에 나서면 온통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저마다 무슨 신발을 신고 있는지, 어떤 신발에 어떤 옷차림인지, 그중에서도 운동화 신은 사람만 보면 반가운 마음에 더 눈길이 갔다. 저 디자인은 어디서 났을까, 저런 컬러라면 때가 좀 타도 예쁘겠다, 뭐 그런 생각들. 늘 다니던 거리였고, 타인의 옷차림이라면 무심히 스치는 풍경 중 하나였을 텐데 한동안 은 신발만 알아보는 안경을 쓴 것처럼 거리가 그렇게 보인 것이다.
비슷한 경험은 또 있다. 집에 하나둘 화분을 늘려가면서부터는, 동네를 산책할 때마다 다른 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에 눈길이 갔다. 원룸 빌라의 작은 창가에 내걸린 베고니아를 보면 누군가 이사 선물로 주지 않았을까 짐작했고, 베란다를 가득 채운 화분들을 보면 저 창의 안쪽에 화초 가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겠구나 싶었다.
벽돌로 세운 화단에 바질이나 로즈마리 같은 허브가 가득 자라고 있는 집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살고 있을 것 같았다. 내가 화분을 키우며 물을 주고 벌레를 잡고 분갈이를 하니, 다 른 사람들의 화분을 보면 그런 시간이 자연스레 함께 보였다. 식물을 기르는 마음엔 어딘가 닮은 구석이 있을 것 같아 괜스레 창 너머 이웃에게 친밀감이 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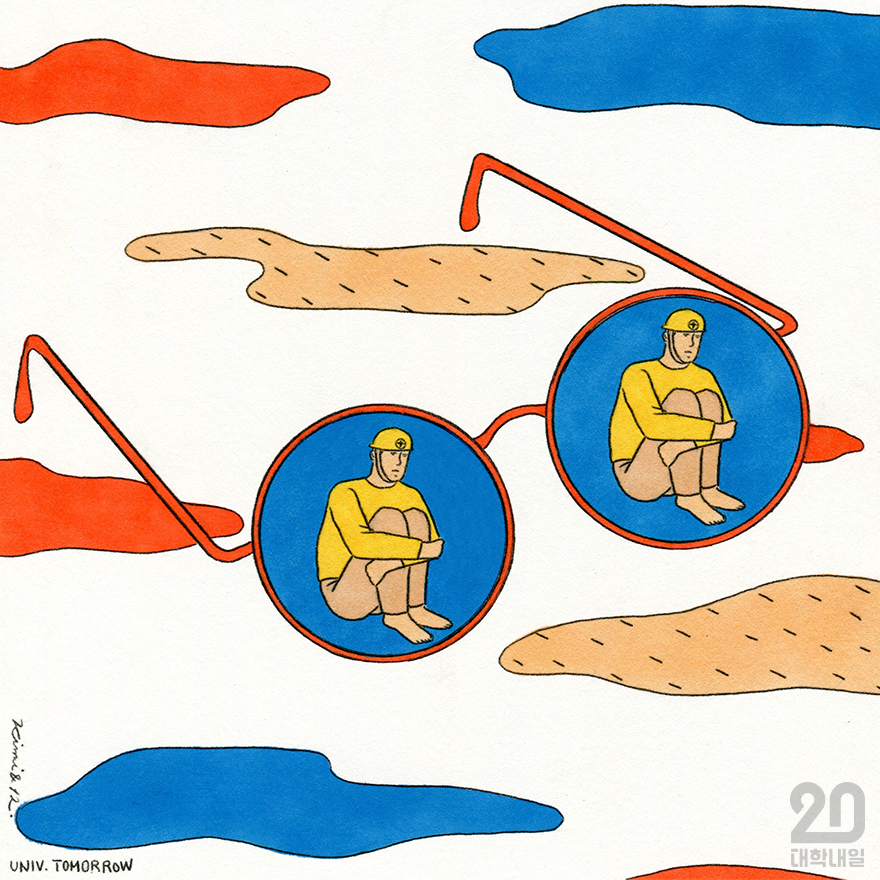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 관심사나 처한 환경에 따라 세상을 선택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당연한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론 새삼스러운 일이다. 풍경이 거기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내가 보려는 것만 보게 된다는 것.
하지만 그 선택적인 시야 덕분에, 때론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관점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젠 멀리 여행을 가서도 창가의 화분을 살피게 된 나처럼.
풍경만 그런 것은 아니어서,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야 세상이 ‘새로고침’되어 보이는 일도 잦다. 주말에 갑작스레 앓다가 월요일 아침 병원 문 열자마자 진료를 받으러 간 날이면, 주말 동안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구나 놀라게 된다. 그냥 버스를 타고 출근한 아침이었더라면,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아프지 않은 사람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겪어봐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라면 너무 더딘 일이 아닐까. 다행히 우리에겐 다른 이의 사정을 듣는 귀도 있다.
<무한도전> 국민내각 편에 나온 한 시민은 임산부를 위한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며 이런 얘길 꺼냈다. 자신처럼 만삭에 가까워지면 주차하고 차문을 열고 나올 때마다 옆에 주차된 차에 배가 긁힐 수밖에 없다고. (아아!)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할머니는 버스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 저상버스만 들어오면 그렇게 반갑다고도 말씀하셨다. (아아!)
무심히 TV를 보다 귀가 확 뜨였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던 탓이다. 주차하고 내릴 때마다 내 몸의 일부가 긁히는 일, 아픈 다리가 잘 굽혀지지 않아 버스 계단이 원망스러운 일. 내게 일어난 적 없으므로, 여태껏 모르고 살았던 세상이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얼마든지 더 열거할 수 있다. 내가 겪은 삶이란 지극히 일부분이어서, 그 외의 것들은 바보 같은 소리(아아!)를 내며 매번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세계란 얼마나 좁은가, 생각하게 된다. 내 경험과 환경 안에서만 이해하는 세계란 결국 딱 그만큼, 1인분의 세계일 뿐이다.
이 땅에만도 5100만의 인구가 살고 있으니, 나를 둘러싼 세상만 보며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작은 상상력이다. 잠시 상대방의 입장에 나를 놓아보는 일. 그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짐작해보는 일.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겪기도 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살기 좋은 세상’ 은 한 사람의 좋음, 또 한 사람의 좋음을 끊임없이 더해가야 하는 세상이란 것도 알게 된다.
며칠 전, 트위터에서 ‘노 키즈 존’이 논란이 된 것을 보며 지난겨울 제주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늘 다니러 가는 동쪽 해안가엔 그사이 새로운 카페들이 많이도 생겨났는데, 해변과 가까운 카페들엔 노 키즈 존을 써 붙인 곳이 많았다. 카페 안엔 친구나 커플끼리 온 20-30대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다.
거기 앉아 오후 내내 책도 읽고 바다도 내다보다 생각했다. 자주 찾던 이런 곳도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면 더 이상 발을 들일 수 없는 곳이 되는구나. 아이를 가진 몇몇 친 구들의 얼굴도 떠올랐다. 그 얼굴들이 저 문 앞에서 맥없이 돌아설 것을 생각하니, 이런 기준으로 입장 가부를 나누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가 싶기도 했다.
아이와 함께 거리에 나섰더니 유모차가 다닐 수 없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기저귀 교환대가 없는 건물은 또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다는 친구의 하소연도 함께 떠올랐다. 논란은 지금도 여전히 뜨겁고, 나는 내가 아는 하나하나의 얼굴들, 그들이 일상적으로 겪을 냉대와 상심에 대해 생각한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함부로 판단 내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인디언 속담은 화장실 문에나 붙어 있는 시시한 금언 같은 것이 되었지만, 그 시시함을 실천하기란 이리도 어렵다. 남의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에 서본다는 말. 거기에 오래 걷기까지 한다면, 한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 사실 ‘판단’은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아니겠지.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어쩌면 그게 다 남의 신발에 발 한번 넣어보는 걸 잊어서가 아닐까 싶을 때가 있다. 일반버 스 계단이 너무 높아 저상버스가 오기까지 그냥 보낸다는 어느 할머니, 남들처럼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 앉고 싶다는 어느 젊은 부모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나는 계속 그들을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굴며 살 것이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하고 잠시 상상해보면 되는 일인데, 어째서 우리는 그런 능력을 좀처럼 쓰지 않을까.
그러니 혹시 내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을 때,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고 싶어질 때,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하는 맘으로 남의 신발에 발 한쪽 밀어 넣고 생각해보려 한다. 그런다고 뭔가를 이해하게 되려나? 세상이 좀 더 나아지려나? 알 수야 없지만 너무 오랜만에 다시 희망이란 걸 생각하게 된 이 땅에서, 나도 새 다짐 하나쯤은 하고 싶다. 아, 일단은 아직 사지 못한 신발부터 사고.
Illustrator 키미앤일이
#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