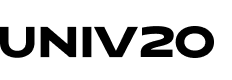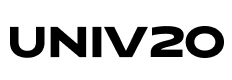대학내일
대학내일 미워하는 이야기.txt
마흔이 넘으니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대학내일」에 원고를 쓰고 원고료를 받으며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대학에 다니던 때에 나는 「대학내일」을 싫어했다. 아니, 딱히 싫어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얇은 잡지를 학내에서 볼 때마다 “흥” “칫” “뽕!” 정도의 시선을 던지며 지나치곤 했다.
죄 없는 「대학내일」을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 하면(아니, 딱히 미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표지, 바로 그 표지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지에 등장하는 여대생 모델 때문이었다. 말간 얼굴에 긴 생머리, 반짝이는 두 눈…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어 보이는 얼굴. ‘여대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무의식중에 떠올릴 그 얼굴. 표지의 여대생을 한 번 보고, 쇼윈도에 비친 나를 한 번 본다. 도저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여대생이라 할 수 없다. 내 머리는 늘 산발, 심지어 감지 않아 떡이 졌다. 화장은커녕 세수도 안 할 때가 태반이고, 누렇게 뜬 피부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한 움큼, 누더기 같은 옷에는 곰팡이까지 슬어 있다. 맑지도, 깨끗하지도, 자신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대학내일」의 여대생을 볼 때마다 화가 났다. 그건 질투심보다는 적개심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그 표정, 내일은 분명 밝을 거라 기대하는 그 표정에 화가 났다. 그렇지. 저런 여대생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기회는 널려 있으며 내일은 밝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내게는 내일이 없었다. 적어도 「대학내일」의 표지 모델인 여학생에게 주어진 그런 내일은.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가장 아름다워야 했을 스무 살 젊은 날을 왜 그렇게 날려버렸단 말인가. 그 시절 나는 두꺼운 아이라인보다 중요한 것이 밝은 미소라는 사실을 몰랐다. 청결이야말로 연애의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나는 그 모든 것에 냉소적인 여자애였다. 하지만 스무 살이 진실로 냉소적이었을 리는 없다.
스무 살이 냉소적인 이유는 냉담함을 가장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다.
“그딴 것도 영화라고 보니?”라고 묻던 나이 많은 삼수생 오빠도,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하고 눈을 부라리던 남자 선배도, “넌 나무같이 단단해 보여”라고 말해주던 여자 선배도, “그런 건 너무 치졸하지 않니?” 하고 비웃던 여자 선배도, ‘게오르그 루카치’니, ‘허우샤오시엔’이니, ‘형이상학적 고찰’이니 같은 단어를 남발하던 이들도,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 체를 하며 기를 쓰고 자신을 지켜야만 했을 것이다. 원칙을 세워야 해, 성을 쌓아 올려야 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안 그러면 휩쓸리기 십상이니까. 안 그러면 잡아먹힐지도 모르니까. 스무 살이 된 나에게 세상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닥쳐왔고, 그 무수하고 다채로운 자극 속에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어서 빨리 이 시기를 탈출해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서 빨리 유능해지고 싶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고 싶었다. 최소한 문제를 읽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빨리 서른이 되고 빨리 마흔이 되기만을 바랐다. 이제 나는 마흔을 갓 넘겼다. 꿈을 이룬 것이다. 마흔이 넘으니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대체로 즐거운 기분이다.
이제 나는 그 시절 간절히 원하던 대로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 풀이는 여전히 어렵다.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도 즐겁다. 전국의 스무 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스무 살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즐겁다. 내일이라고는 없을 것처럼 살던 스무 살의 내게, 마흔 살의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없다. 미안하지만 없다.
화장을 곱게 하고 좀 웃으라는 이야기나, 미련 떨지 말고 주택청약이라도 들라는 이야기나, 네이버의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나(그때만 해도 네이버는 야후나 다음,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나, 실컷 놀고 실컷 즐기라는 이야기 같은 것도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원래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정쩡하고 괴롭고 갑갑하고 엉망진창인 그 시기는 원래 괴로워하면서 넘기는 것 말고는 딱히 답이 없기 때문이다. 괴로워야 할 때 충분히 괴로워하지 않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 있으리라고는, 멀쩡히 살아서 자식까지 둘이나 낳고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나의 내일을 상상하지 못한 것만큼이나 「대학내일」이 여전히 살아남으리라는 상상도 못 해봤다. 심지어 내가 「대학내일」에 글을 쓰고 있으리라는 상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 20년 가까이 살아남았다.
어쩌면 이것, 살아남은 것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대학내일」보다 지금의 「대학내일」이 훨씬 재미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재미있었더라면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딱히 미워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학내일」, 건승하십시오.
죄 없는 「대학내일」을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 하면(아니, 딱히 미워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표지, 바로 그 표지 때문이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지에 등장하는 여대생 모델 때문이었다. 말간 얼굴에 긴 생머리, 반짝이는 두 눈… 맑고 깨끗하고 자신 있어 보이는 얼굴. ‘여대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90%가 무의식중에 떠올릴 그 얼굴. 표지의 여대생을 한 번 보고, 쇼윈도에 비친 나를 한 번 본다. 도저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여대생이라 할 수 없다. 내 머리는 늘 산발, 심지어 감지 않아 떡이 졌다. 화장은커녕 세수도 안 할 때가 태반이고, 누렇게 뜬 피부에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한 움큼, 누더기 같은 옷에는 곰팡이까지 슬어 있다. 맑지도, 깨끗하지도, 자신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나는 「대학내일」의 여대생을 볼 때마다 화가 났다. 그건 질투심보다는 적개심에 가까웠다. 무엇보다 그 표정, 내일은 분명 밝을 거라 기대하는 그 표정에 화가 났다. 그렇지. 저런 여대생에게 세상은 아름답고 기회는 널려 있으며 내일은 밝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지 않았다. 내게는 내일이 없었다. 적어도 「대학내일」의 표지 모델인 여학생에게 주어진 그런 내일은.
도대체 나는 왜 그렇게 살았단 말인가. 가장 아름다워야 했을 스무 살 젊은 날을 왜 그렇게 날려버렸단 말인가. 그 시절 나는 두꺼운 아이라인보다 중요한 것이 밝은 미소라는 사실을 몰랐다. 청결이야말로 연애의 필수 덕목이라는 사실도 몰랐다. 나는 그 모든 것에 냉소적인 여자애였다. 하지만 스무 살이 진실로 냉소적이었을 리는 없다.
스무 살이 냉소적인 이유는 냉담함을 가장하기 때문이다. 왜 그런 짓을 하느냐 하면,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그 시절에는 우리 모두가 그랬다.
“그딴 것도 영화라고 보니?”라고 묻던 나이 많은 삼수생 오빠도, “너 왜 나한테 인사 안 하냐?” 하고 눈을 부라리던 남자 선배도, “넌 나무같이 단단해 보여”라고 말해주던 여자 선배도, “그런 건 너무 치졸하지 않니?” 하고 비웃던 여자 선배도, ‘게오르그 루카치’니, ‘허우샤오시엔’이니, ‘형이상학적 고찰’이니 같은 단어를 남발하던 이들도, 모두 비슷했을 것이다.

세상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으면서 아는 체를 하며 기를 쓰고 자신을 지켜야만 했을 것이다. 원칙을 세워야 해, 성을 쌓아 올려야 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안 그러면 휩쓸리기 십상이니까. 안 그러면 잡아먹힐지도 모르니까. 스무 살이 된 나에게 세상은 그야말로 갑작스럽게 닥쳐왔고, 그 무수하고 다채로운 자극 속에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어서 빨리 이 시기를 탈출해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서 빨리 유능해지고 싶었다.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풀고 싶었다. 최소한 문제를 읽기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빨리 서른이 되고 빨리 마흔이 되기만을 바랐다. 이제 나는 마흔을 갓 넘겼다. 꿈을 이룬 것이다. 마흔이 넘으니 어떤 기분이 드느냐 하면, 대체로 즐거운 기분이다.
이제 나는 그 시절 간절히 원하던 대로 문제를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하지만 문제 풀이는 여전히 어렵다. 풀어야 할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도 즐겁다. 전국의 스무 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스무 살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즐겁다. 내일이라고는 없을 것처럼 살던 스무 살의 내게, 마흔 살의 내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없다. 미안하지만 없다.
화장을 곱게 하고 좀 웃으라는 이야기나, 미련 떨지 말고 주택청약이라도 들라는 이야기나, 네이버의 주식을 사라는 이야기나(그때만 해도 네이버는 야후나 다음,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중 하나일 뿐이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라는 이야기나, 실컷 놀고 실컷 즐기라는 이야기 같은 것도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그 시기는 원래 그런 시기이기 때문이다. 어정쩡하고 괴롭고 갑갑하고 엉망진창인 그 시기는 원래 괴로워하면서 넘기는 것 말고는 딱히 답이 없기 때문이다. 괴로워야 할 때 충분히 괴로워하지 않는 것도 인생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 있으리라고는, 멀쩡히 살아서 자식까지 둘이나 낳고 살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
나의 내일을 상상하지 못한 것만큼이나 「대학내일」이 여전히 살아남으리라는 상상도 못 해봤다. 심지어 내가 「대학내일」에 글을 쓰고 있으리라는 상상은 정말이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모두 20년 가까이 살아남았다.
어쩌면 이것, 살아남은 것이야말로 정말로 대단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내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의 「대학내일」보다 지금의 「대학내일」이 훨씬 재미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재미있었더라면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니, 딱히 미워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대학내일」, 건승하십시오.
[858호 - think]
Writer 한수희 kazmikgirl@naver.com Illustrator 키미앤일이
#858호#858호 think#858호 대학내일